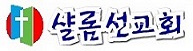書き込み数 1,519
| 사진은 누가 발명했는가? -2/2 | |
진정한 사진술의 발명가는 프랑스의 니에프스냐 다게르냐 하는 지난 호의 논의에 이어 이번호에는 영국이 사진술의 발명가로 주장하는 헨리 폭스 탈보트(W.H. Fox talbot)의 연구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탈보트는 ‘카로타입 (calatype;종이인 화법)’을 발명하여 명암이 반대로 나타나는 즉 음화와 양화로 구분되어 음화 한 장으로 많은 양의 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과연 사진은 누기 발명했나? 그 궁금증을 풀어본다. <편집자주> | |
 | |
| 왼쪽부터 니에프스, 탈보트, 다게르 | |
탈보트의 탈보타입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진술은 프랑스의 니에프스와 다게르에 의해 연구 발명되어 1839년 8월 19일 전세계에 공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영국사람들은 사진술의 진정한 발명자는 영국의 헨리 폭스 탈보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와같이 영국에서 진정한 사진술의 발명자를 탈보트로 주장하게 된 이유는 사진술의 발명을 다게르 보다 탈보트가 먼저 했으며, 또한 탈보트의 ‘종이 인화법’은 명암이 반대로 나타나는 즉 음화와 양화로 되어 한 장의 음화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양화로 만들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사진술의 기초적인 원리가 되었다는데 있다. 다만 사진술의 발명 공표를 영국측이 프랑스보다 뒤늦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사진술 발명 150주년을 맞으면서 전세계는 사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창간호에 “사진은 누가 발명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특집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한바 있다. 앞으로 본지는 150년에 이르는 사진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재하여 독자의 사진역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사진의 종주국인 프랑스에서는 매스컴을 통해 사진술 발명 150주년을 맞아 지난날 사진술 발명에 따르는 두 사람의 공로자(니에프스와 다게르)중에서 격하된 니에프스의 공로를 격상시키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영국에서도 세계 최초의 사진술 발명자를 자국의 폭스 탈보트라고 주장하는데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영국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기 위하여 탈보트와 그의 ‘종이인화법’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 |
 | |
탈보트, ‘열리 문’ 카로타입 자연의 연필, 1844년(왼쪽), 종이인화법(카로타입)을 발명한 영국인 윌리암 헨리 폭스 탈보트(1800~1877)(오른쪽) | |
탈보트의 착상 니에프스와 다게르 두 사람이 프랑스에서 사진술 발명연구에 열중하고 있던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하던 몇 사람의 과학자가 있었다. 이들 과학자들은 니에프스나 다게르가 사진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또한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의 사진술 연구를 모르고 있었다. 영국에서 연구를 하던 사람은 헨리 폭스 탈보트(1800~77)였다. 탈보트는 ‘카로타입’ 이라고 불리우는 종이인화법의 발명자로서 영국국민들은 사진술의 발명자를 탈보트로 못박고 있다. 탈보트는 영국의 명문대학 캠브리지에서 수학을 전공했으며 1831년에는 젊은 과학자로서 영국왕립협회회원으로 선임될 정도로 유능한 인물이었다. 1838년에는 자유당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했으나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사진술 발명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의원이 된 해의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시도한 유럽여행 도중에 사진술 연구에 전념할 것을 결심했다. 탈보트는 당시의 사정을 그의 저서 ‘자연의 연필’(1844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33년 8월 초 어느날 나는 이태리의 아름다운 코모호반에서 영국의 윌리엄 하이드 워러스턴이 고안한 카메라 루시다를 사용하여 스케치를 하려고 했지만 마음먹은대로 되질 않았다. 이 카메라 루시다는 화가의 도구로 그림에 대한 재능이 없이는 영상에 대한 스케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몇 해를 걸쳐 실험에 온 방법을 재차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이 방법이란 ‘카메라 옵스큐러’를 사용해서 초점판이 되는 트래싱페이퍼에 대상물의 상(像)을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이 상은 마치 요정이 그린 그림처럼 순간적인 창작으로 삽시간에 소멸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안 나는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만약 이 자연의 영상을 언제까지나 종이 위에 고정시켜 남길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신비로은 일이겠는가!” | |
 | |
| 그림복사, 초상촬영, 일광에 의한 인화, 조각의 촬영 등을 보여준다. | |
 | |
| 탈보트, ‘창문의 종이그림’, 1835년 | |
 | |
| 탈보트, ‘아침식탁’ 광선화, 1840년 | |
탈보트는 유럽여행을 마치고 1834년 1월 영국에 돌아오자 즉시 종이 위에 감광성을 투여하는 실험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초산은을 재료로 실험을 했으나 감광성이 미약해서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염화은을 사용해서 실험했다. 이 방법은 양질의 종이에다 염화나트륨(식염)의 용액을 바르고 그것이 건조되면, 초산은의 용액을 도포한다. 이때 두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불용성(不溶性)이며 감광성이 있는 염화은은 종이의 섬유속에 침투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종이에 나뭇잎이나 레이스를 놓고 유리로 누른다. 종이는 나뭇잎이나 레이스로 가려진 부분 이외는 광선이 쪼여져 검게 되었다. 더욱 농도가 짙은 염화나트륨용액은 검게 변하는 속도가 늦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835년 2월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정착작용(定着作用)의 방법을 고안했다. 탈보트는 이왁같은 연구를 토대로 카메라 옵스큐러에 의한 영상고정을 실험하기 시작했지만 감광성이 약해서 쉽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2인치의 초점거리를 가진 현미경 렌즈를 2인치 ½입방 크기의 소형카메라에 부착하고 거기에 1인치 크기의 사각 종이 네가티브를 넣고 여러곳에서 촬영을 시도했다. 노출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고 모두 잘 찍혔다. 이때 찍은 한 장의 사진에 1835년이라는 연대의 사인이 기입되어 현재 런던의 과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후 탈보트는 약3년동안 사진술 연구를 중단하고 광파의 이론적 연구, 편광, 석회광에 대해 연구했으며 또한 고고학의 연구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저서도 펴냈다. 1839넌 1월 7일 프랑스 과학학사원에서 아라고박사가 다게르타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뉴스를 전해 듣고 탈보트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만약 다게르가 연구한 사진술의 방법이 자기의 방법과 동일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크게 걱정했다고 한다. 탈보트는 자기의 발명이 다게르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선취권을 확보하기 위해 런던의 왕립과학원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냈다. 그 사진은 ‘꽃과 나뭇잎’, ‘레이스의 모양’, ‘판화의 베니스 풍경’ 등으로 1835년 여름 카메라 옵스큐러를 사용해서 만든 것들이었다. 이 사진들은 1839년 1월 25일 왕립과학원에서 있었던 강연회 석상에서 유명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마이켈 파르디박사(1791~1861년)에 의해 소개되었다. 탈보트는 자신이 연구한 사진술의 방법인 종이인화법을 '포토 제닉 드로잉 이라고 불렀다. 이 방법은 명암이 거꾸로 되어 나타난다. 실제의 어두운 부분은 밝고 광선을 받는 밝은 부분은 어둡게 된다. 이것을 복사하면 명암이 거꾸로 되어 정상적인 명암이 된다. 탈보트의 친구인 천문학자 죤 허셀은 이 명암의 어두운 부분은 네가티브, 밝은 부분을 포지티브로 명명했다. 즉 한 장의 네가티브를 가지고 몇장이든 포지티브로 만들 수 있으며 이 발명은 오늘날 사진술의 기초가 되는 셈이다. | |
 | |
| 1840년대로 추정되는 카로타입. 이 방법은 영국인 헨리 폭스 탈보트의 발명품이다. 이것 은 양화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음화이다. 이 카로타입에서 사진술의 발전 및 응용이 생겨났다. (단,다게르타입이 단일영상으로만 통용됐을 경우). 사진은 투명하게 나타난 종 이위에 음화(왼쪽) 음화에서 얻은 양화. 소금물에 담갔다가 질산은으로 인화했다.(오른쪽) | |
 | |
| 1840년의 영국 ‘Reading'지에 게재된 폭스 탈보트의 작업실 | |
| 탈보트는 다게르타입의 완성에 자극되어 자기의 프로세스에 대한 개량에 노력하였다. 1840년 9월에는 감광도를 높이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다게르타입과 동일하게 단시간 노출과 현상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완성한 셈이다. 탈보트는 자기의 이 프로세스에 ‘카로타입(’카로‘는 아름답다는 의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그후 친구의 권유에 의해 ‘탈보타입’ 이라고 고쳐 1841년 2월 영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했다. 프랑스정부가 다게르타입의 특허권을 개인에게 허용하지 않았던데 반해 영국정부에서는 탈보트에게 사진술 발명특허권을 개인의 권리로 귀속시켰다. 이로 인해서 영국에서는 당시 사진술에 대한 특허권 문제로 법정투쟁이 벌어지는 등 한때 시끄러웠다. | |
 | |
카로타입을 보고 있는 미국인 프리드릭 랑겐하이므 씨(왼쪽) 탈보트, 레이스를 감광지에 밀착노출시켜서 만든 광선화(오른쪽) | |
정착(定着)법의 발견 폭스 탈보트 이외에 영국에서 사진술 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과학자는 여러명 있었지만 이 중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죤 허셀(1791~1871)이었다. 죤 허셀은 정착법(定着法)의 발견과 수은증감법의 발명, 청사진프로세스의 완성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포토그라프ㆍ포토그라피(寫眞)‘라는 용어를 창안했고 또한 포지티브, 네가티브라는 용어도 죤허셀이 최초로 쓰기 시작했다. 죤 허셀은 영국의 귀족 출신으로 물리ㆍ화학자로 큰 공을 세웠다. 그는 프랑스에서 다게르타입이 공표되자 그후 사진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죤 허셀이 사진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것은 ‘定着 ’법의 발견이었다. 그는 하이포가 염화은(鹽化銀)의 용제(溶劑)로서 적절하다는 사실을 1819년에 발표했다. 하이포에 의한 미감광염화은의 제거가 탈보타입에 가장 좋고 적합하다는 것을 탈보트에게 알려 주었다. 다게르도 처음에는 식염(食鹽)을 정착에 사용하다가 후에는 하이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오늘날 까지 하이포는 정착제로 사진프로세스의 근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
 | |
| 니에프스가 첫 테스트를 위해 사용한 ‘black chamber' .사이드당 0.3cm를 측정하여 여러 기능을 관찰하기 위해 세 개의 작은 구멍을 뚫었다. Marquis d'lvory는 Chalons-sur-sorone에 있는 니에프스 박물관에 이것을 기증했다.(왼쪽) 다게르가 니에프스에게 ‘black chamber'를 정확히 1829년에 빌려 주었다. 크기는 16cm의 조리개를 가진 높이 36cm, 폭 35cm, 깊이 63cm의 목재상자는 오늘날에도 발견할 수 없는 어연감광판(zine plate)으로 카바되었다.(오른쪽) | |
크로죤 프로세스 런던 과학박물관의 공식기록에는 ‘사진술의 아버지가’가 7명으로 되어 있다. 즉 니에프스, 다게르, 탈보트, 죤 허셀 그리고 코로죤시스템을 발명 발전시킨 스코트 아처, 리차드 마독스, B 리드 등 3명이다. 사진술 발명의 역사적인 가치측면에서 볼때 앞서 밝힌 네 명의 업적에 비하면 코로죤시스템을 발명하고 이를 발전시킨 세 사람의 업적은 약간 뒤지는 것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니에프스의 헤리오그라피, 다게르타입, 또는 탈보타입 등 초기 사진술을 발전적으로 추진시키는데 이들의 역할과 공적은 결코 경시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7명의 ‘사진술의 아버지’는 런던 과학박물관의 공식적인 기록이지만 이외에도 2명의 선각자를 추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 9명의 선각자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사진을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어렵다. 만인이 납득하고 긍정할 수 있는 대답은 없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말하자면 수학의 답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정식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진술의 발명자로는 프랑스의 다게르를 꼽고 있다. 특히 미국의 사진사가인 버먼드 뉴홀도 1839년 8월 19일 다게르타입의 공식발표를 사진술 발명의 날로 긍정하고 있다. | |
 | |
이 다게르타입(은판사진)은 파리에서 최초로 팔린 것 중 하나이다. 1839년 8월경의 것으로16×21cm의 감광판(plaque)으로 사진을 뽑는다. 이것엔 No. 6의 칭호가 붙어있고 제작자의 사인과 다게르의 보증이 있다, 광학기계상인 Lerebours가 만든 Simple 렌즈로 장착되어 있다. 그러나 조리개는 장착되어 있지 않다. 발명이 알려지고 얼마 후 Lerebours는 자신의 다게르타입을 내세우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http://www.photoart.co.kr/community/bbs.php?table=series_03&query=view&uid=88&p=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