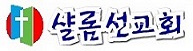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룬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현재 이라크)인들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딩길(dingir)’이라고 불렀다. 쐐기문자로 ‘딩길’은 ‘하늘의 별’을 형상화한 모양이다. 수메르인들은 ‘딩길’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항존하지만 접근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을 ‘네체르(neter)’라고 불렀다. 네체르는 깃발 모양을 하고 있다. 깃발이 게양된 장소, 즉 신전에 거하는 존재를 ‘네체르’라고 부른 것이다. 이집트인들 또한 네체르가 우주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창조적으로 만나 일궈 낸 종교가 있다. 바로 ‘아브라함 종교’다. ‘아브라함 종교’는 신에 관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당시 경향을 폭넓게 부르는 용어다. 기원전 20세기께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란 인물에게 신은 이전의 신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개인을 선택하는 인격적인 신으로 등장한다. 아브라함이 실체적으로 신의 목소리를 들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신의 명령에 따라 떠난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신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여행을 통해 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종교들, 즉 각기 기원전 6세기, 기원후 1세기, 기원후 7세기에 창시되는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조상이 됐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반인 30억 인구가 아브라함 종교들을 신봉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여행이 뿌린 씨앗은 기원전 13세기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싹을 틔웠다. 모세는 미디안 사막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어느 날 전혀 새로운 광경을 목격한다. 사막에 쓸쓸히 서 있는 가시덤불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을 내거나 연소되지 않는, 소위 인간의 경험을 상회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R 오토는 모세는 이 ‘누미노제(Nouminose)’와 마주친 반응을 종교라 했다. 오토에 따르면 누미노제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그 속성들은 다음 세 가지 메타포(metaphor)로 나열할 수 있다.
첫째는 ‘감춤’이란 의미를 가진 라틴어 단어 ‘미스테리움(Mysterium)’이다. 인간은 신의 전체상을 볼 수 없다. 인간은 기껏해야 그 일부분을 이해하거나 발견할 따름이다. 둘째는 ‘전율’이란 의미를 가진 ‘트러멘둠(Tremendum)’이다. 신 앞에서 인간은 떨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주의 수많은 별·블랙홀·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게 사실이다. 셋째는 ‘매력’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 ‘파시노숨(Fascinosum)’이다. 인간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절대 다름’을 지니고 있는 ‘신’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창조적으로 만나 일궈 낸 종교가 있다. 바로 ‘아브라함 종교’다. ‘아브라함 종교’는 신에 관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당시 경향을 폭넓게 부르는 용어다. 기원전 20세기께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란 인물에게 신은 이전의 신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개인을 선택하는 인격적인 신으로 등장한다. 아브라함이 실체적으로 신의 목소리를 들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신의 명령에 따라 떠난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신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여행을 통해 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종교들, 즉 각기 기원전 6세기, 기원후 1세기, 기원후 7세기에 창시되는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조상이 됐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반인 30억 인구가 아브라함 종교들을 신봉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여행이 뿌린 씨앗은 기원전 13세기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싹을 틔웠다. 모세는 미디안 사막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어느 날 전혀 새로운 광경을 목격한다. 사막에 쓸쓸히 서 있는 가시덤불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을 내거나 연소되지 않는, 소위 인간의 경험을 상회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R 오토는 모세는 이 ‘누미노제(Nouminose)’와 마주친 반응을 종교라 했다. 오토에 따르면 누미노제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그 속성들은 다음 세 가지 메타포(metaphor)로 나열할 수 있다.
첫째는 ‘감춤’이란 의미를 가진 라틴어 단어 ‘미스테리움(Mysterium)’이다. 인간은 신의 전체상을 볼 수 없다. 인간은 기껏해야 그 일부분을 이해하거나 발견할 따름이다. 둘째는 ‘전율’이란 의미를 가진 ‘트러멘둠(Tremendum)’이다. 신 앞에서 인간은 떨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주의 수많은 별·블랙홀·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게 사실이다. 셋째는 ‘매력’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 ‘파시노숨(Fascinosum)’이다. 인간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절대 다름’을 지니고 있는 ‘신’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모세는 이 엄청난 만남에서 신의 본질에 대해 질문한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은 “나는 나다”고 대답한다. 이 문장을 풀어서 이해하지만 ‘신’은 다른 인간의 용어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신은 ‘본질’과 ‘현상’이 일치하는 존재다. 이 대답을 이해할 수 없는 모세에게 신은 자신의 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자신은 인간의 고통을 방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은 인간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인간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라는 것이다. 신이 되기 위한 조건을, 신 자신이 ‘연민(compassion)’이라고 정의했다. 이집트인들의 학대로 히브리인들이 받는 고통을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둘째, 신은 모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태고부터 인간의 삶이 깊이 관여한 존재라고 말한다. 신은 인간이 신이란 개념을 만들어 내면서부터 존재한, 혹은 인간 상상력을 투여한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주와 함께해 온 존재다. 그런 후 신은 모세에게 새로운 미션을 준다.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해방하라는 명령이다. 모세는 더 이상 한낱 양치기로 남아 있을 수 없었다.
명령 앞에서 모세는 자신은 일개 목동이라고 항변하지만, 신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뜻은 모세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모세 이상의 존재,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모세는 깨달음을 통해 신의 대리자가 된다. 아브라함 전통에서 이 사상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 말은 힌두교 경전인 ‘우파니샤드(Upanisad)’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한다. 스승 오달라카가 자신의 아들에게 “타트 트밤 아시(tat tvam asi)”, 즉 “네가 바로 그것이다”고 인간과 신의 관계를 정의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인간은 ‘아담’, 즉 ‘흙’이라고 불렀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 ‘안쓰로포스’라고 불렀다.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덧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추구할 만한 가장 숭고한 삶의 전형을 제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둘째, 신은 모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태고부터 인간의 삶이 깊이 관여한 존재라고 말한다. 신은 인간이 신이란 개념을 만들어 내면서부터 존재한, 혹은 인간 상상력을 투여한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주와 함께해 온 존재다. 그런 후 신은 모세에게 새로운 미션을 준다.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해방하라는 명령이다. 모세는 더 이상 한낱 양치기로 남아 있을 수 없었다.
명령 앞에서 모세는 자신은 일개 목동이라고 항변하지만, 신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뜻은 모세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모세 이상의 존재,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모세는 깨달음을 통해 신의 대리자가 된다. 아브라함 전통에서 이 사상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 말은 힌두교 경전인 ‘우파니샤드(Upanisad)’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한다. 스승 오달라카가 자신의 아들에게 “타트 트밤 아시(tat tvam asi)”, 즉 “네가 바로 그것이다”고 인간과 신의 관계를 정의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인간은 ‘아담’, 즉 ‘흙’이라고 불렀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 ‘안쓰로포스’라고 불렀다.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덧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추구할 만한 가장 숭고한 삶의 전형을 제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