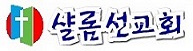동남아시아 선교전략
1. 동남아시아의 개념
동남아의 특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용어는 다양성이다. 동남아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힌두교와 이슬람, 카톨릭과 개신교, 유교와 도교등 거의 모든 세계종교가 들어와 있으며, 이들 외에 나라마다 여러형태의 민간신앙이 발달해 있다. 또한 민족적으로도 다양하며, 특히 나라마다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다.
동남아는 중동이나 라틴아메리카처럼 종교적이나 민족적으로 상당한 공통성을가진 지역과는 달리 하나의 지역으로 보기에는 무리이다. 동남아는 실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사실 외에는 아무런 지역적 특징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되는 것은 서양인들 때문이었다. 동남아란 용어는 식민주의 시대에 서양인들이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동기에서 탄생시킨 것이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지녀온 동남아의 다양한 민족들에게는 과거에 동남아라는 어떤 통일된 지역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서 동남아 사람들은 동남아란 용어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인들의 식민주의적 접근과 외부적 시각을 통해 탄생된 동남아가 이제는 동남아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내부적 시각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륙동남아시아와 도서동남아시아
동남아의 이해를 위한 한 중요한 단서로서 동남아가 종종 ‘대륙동남아’와 ‘도서동남아’로 구분되는 것이다. 대륙동남아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그리고 도서동남아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지리적으로 볼 때 대륙동남아에 포함되어야 할 말레이반도 남부의 말레이시아 영토가 도서동남아에 속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기준에 의한 구분에 연유한다. 즉 테라바다(Theravāda)불교의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대승불교의 베트남 등 대륙동남아가 불교문화권임에 비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도서동남아의 대부분은 이슬람문화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그 인구의 ¾이상이 중국인인 싱가포르는 오늘날 종교적으로 유교와 불교에 의해 대표되며, 필리핀은 남부의 무슬림인 모로(Moro)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독교화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초 영국인들에 의해 건설되기 이전의 싱가포르가 역시 말레이 무슬림 지역이었고, 16세기 중엽 스페인인들에 의한 식민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필리핀이 대부분 이슬람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위의 분류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으며, 동남아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분류가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대륙동남아가 각국별로 버마족, 타이족, 라오족, 크메르족, 비엣족 등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도서동남아는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민족적, 언어적으로 말레이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과 함께, 대륙동남아는 몬순 기후를 지녀 우기와 건기의 구별이 분명한데 비해, 도서동남아는 습윤열대 기후로서 일년동안 골고루 비가 내린다는 차이가 또한 있다.
외부의 영향들
중국문화와 인도문화는 전파 후 동남아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 주류문화로 발전하여 그 지역의 지배엘리트들의 사고 및 생활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치문화를 형성했다. 동남아에서 상부구조적인 새로운 문화전통으로 뿌리를 내린 이 중국 및 인도문화는 동남아에서 여러 고대왕국들이 일어나고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중국의 영향
동남아의 고대문화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주로 대륙동남아, 그것도 베트남에 집중되었다.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에 중국에 의해 정복당한 후 1050년간 중국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식민지지배 기간 중국문화의 전반적인 요소들이 베트남 사회에 깊이 스며들었다. 중국과의 접촉의 초기부터 상인, 군인, 관리, 학자, 불교승려, 피난민 등등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중국인들이 북베트남 지역으로 들어와 부분적으로는 토착주민들과의 결혼을 통해 베트남 민족적 요소에 중국적 자취를 남겼으며, 헤어스타일, 의복, 신발, 식사예법 등 일상생활로부터 쟁기,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관습과 기술을 베트남 사회에 전달, 이식했다. 기원 2-3세기에 인도 혹은 중앙아시아로부터 들어온 불교는 그후 중국 대승불교의 승려들과의 접촉을 통해 더욱 발전했으며, 중국 근원의 도교 및 유교와 함께 베트남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했다.
정치철학으로서 유교는 중국의 식민지통치 기간 행정체제, 법 등의 형태로 베트남 사회에 이식되었다. 중국의 영향은 베트남이 939년에 독립을 획득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리(Ly)왕조 시대(1009-1225)인 1070년대에 유교문화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공자사당인 문묘(文廟)가 세워졌고,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유학자의 양성을 위한 국자감(國子監)이 설치되었다. 베트남의 통치자들은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정치문화를 모방, 수용키 위해 노력했는데,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들이 중국의 정치제도의 효율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회적 질서와 우주와의 조화된 생활을 강조하며 국가의 윤리적 구심점으로서의 왕권을 지지하는 유교의 정치철학은 베트남 관료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 정착했다. 이러한 이념적, 제도적인 영향과 함께 베트남에 들어온 한자와 한문은 한국에서의 경우와 같이 고(古)베트남 정부의 공식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베트남인들의 언어정서와 문학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2)인도의 영향
오늘날 동남아의 세계적인 불교 및 힌두교 사원들이 시사하거니와, 고대 동남아에 들어온 외래문화들 중 더욱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준 것은 인도문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지어 동남아의 “인도화”(Indianization)란 개념이 흔히 사용된다. 인도문화는 오늘날 동남아사회의 일상생활에 깊이 배여 있다. 테라바다불교 국가들인 미얀마, 태국, 라오스,캄보디아의 문자체계는 모두 인도의 데바나가리(devanagari)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어를 제외한 동남아의 언어들에서 학문, 정치, 종교, 전쟁 등 분야의 중요한 개념들은 대부분 산스크리트에서 온 것이다. 대개 평화로운 접촉을 통한 “인도화” 과정의 바탕에는 인도문화를 수용할 능력이 있었던 동남아의 토착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토양이 있었다.
동남아 곳곳에서 발견되는 인도 정치문화의 정착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자들은 특히 브라흐만들이었다. 우주적 질서의 운행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들은 동남아 궁정에서 구체적으로는 법률의 제정, 국가적 의식의 수행, 주요행사를 위한 길일(吉日)의 선택, 달력의 제정 등에서 왕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토착 왕권과 왕조를 위해 이념적, 의식적(儀式的) 바탕을 제공했는데, 이때 예를 들어 인도의 법전인 다르마샤스트라(Dharmaśāstra)와 정치지침서인 아르타샤스트라(Arthaśāstra) 등이 소개되어 동남아 정치문화의 중요한 바탕을 형성했다.
(3)이슬람의 영향
동남아에 이슬람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수마트라 북부의 뻐를락(Perlak)에 1292년경 이슬람이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마르코 폴로의 보고를 근거로, 이슬람 왕국들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13세기 후반부터라고 간주되고 있다. 초기 이슬람의 전파에서 오래 전부터 동남아와 무역접촉을 해오던 아랍 및 페르시아인들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의 확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도의 무슬림, 특히 13세기말에 확고한 이슬람 왕국이 된 구자라트(Gujarat)의 무슬림 상인들이었다고 본다.
이슬람의 동남아 전파는 이처럼 남중국해에 진출한 인도양의 상인들의 무역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들의 무슬림 무역공동체들이 수마트라의 북부해안, 말레이반도의 해안, 자바의 북부해안, 보르네오, 술라웨시(Sulawesi) 등에 세워지면서 이슬람화가 조용히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법(sharia)에 따라 거래를 하는 무슬림 상인들의 네트워크에 동남아 토착상인들, 특히 말레이 상인들이 참가함으로써 이슬람화가 본격적으로 진척되었다. 이슬람화 과정은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에 술탄 제도가 확립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로써 술탄의 통치영역내에서 이슬람의 정치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통치영역의 확대와 함께 이슬람이 확산이 더욱 촉진된 것이다. 이슬람 전파의 일반적인 성격에서 끝으로 언급할 것은 신(Allāh)과의 합일과 영적 체험을 중시하며 이를 위해 금욕적 수행과 영적인 감성의 표현으로서 노래과 춤 그리고 꾸란(qur’ān)의 암송을 강조하는 수피즘(Sufism)이 동남아 토착인들의 관심에 호응하여 이슬람 전파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수피들의 교단인 타리까(tarīqa)는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무슬림 상인들을 결속시키는 조직체로서 무슬림 공동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슬람은 14-15세기에 도서동남아에서 대중적 종교운동으로서 확산되어, 14세기 후반에는 수마트라의 내륙지방인 미낭까바우(Minangkabau)에까지 침투해 들어갔으며, 1380년대에 말레이반도의 뜨렝가누(Trengganu)가 이슬람 왕국이 되어 있었고, 1400년경에는 브루나이의 통치자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 확산과정에서 이제는 토착인, 특히 말레이 상인들이 그 중심적인 추진세력이 되었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5세기초에 강력한 해상무역 왕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말라카였다. 15세기에는 수마트라의 여러 지역과 말레이반도 남부 그리고 자바의 북부해안이 이슬람화되었다. 15세기말에는 말루꾸 제도로 이슬람이 전파되었으며, 보르네오와 술라웨시를 거쳐 필리핀으로도 건너갔다. 그러나 도서동남아 세계의 실제적인 이슬람화는 점진적인 것이었으며, 기독교신앙을 가진 유럽인들의 도래 이후 종교적 경쟁의 양상을 띠면서 가속화되었다.
(4)서구의 식민지 영향
동남아는 19세기말까지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식민지가 되었다. 불교화된 대륙부분이건 이슬람화된 도서지역이건 동남아의 토착정부들은 월등한 화력을 갖춘 서양인들의 무력적 위세에 굴복치 않을 수 없었다.
유럽인들의 동남아 진출은 1511년 포르투갈인들의 말라카 점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프랑스 역시 동남아에 진출하여 무역적 이익을 두고 서로 경쟁했다. 17세기말에 이 무역경쟁에서 승리자로 남은 네덜란드는 말레이세계에 광활한 식민지제국을 구축하여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영토적 모형을 마련했다.
서구 식민주의 영향은
①정치적인 면을 보면, 우선 동남아 국가들의 영토적 경계선의 확정을 들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후 각각의 식민 지역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세력을 구축한 유럽인들은 그 세력을 바탕으로 통치 지역들의 국제적 국경을 확정했으며, 이것은 오늘날 동남아 국가들의 국경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식민체제의 행정을 통해 전통적 정치 제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어 궁극적으로는 동남아 정치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 예컨대 식민정부들에 의해 절대왕정제가 폐지되었고 그 대신 의회민주주의식 정치체제가 도입되었다.
②식민주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구의 산업화의 결과 자원공급지 및 상품수요지로서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근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양인들의 식민통치에 편승하여 동남아에 진출한 서구의 자본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토착사회에 적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추구했다. 서구의 자본은 그밖에 조선업과 광산업 등에도 투자되었으며, 효율적인 행정과 경제적 착취를 위해 도로와 철도가 건설되어 주요 도시들과 농업 및 공업 지역을 연결했다.
③사회적으로 식민통치는 무엇보다도 도시화와 근대적 교육을 가져왔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전통적 동남아 도시들은 식민통치와 유럽의 경제적 영향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어, 시장과 무역이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됨으로써 전통적 도시들은 지역적으로 슬럼화되었다. 영국 통치하의 식민지들에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인구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차후 국민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심각한 종족갈등의 뿌리가 되었다.
식민정부들이 도입한 근대식 학교교육은 비서구 지역의 “문명화 사명”(civilizing mission)의 동기와 직접적으로는 식민지배를 위한 토착인력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후자와 관련하여 제공된 유럽어를 통한 고등교육의 수혜자는 주로 토착사회의 상층부 자제들이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식민정부의 토착인 공무원들은 사회의 새로운 엘리트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근대적 교육을 통해 식민통치의 현실과 자국의 사회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된 토착 엘리트들은 동남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민족주의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5)현대 동남아의 사회문제
탈식민지 시대에 들어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처해진 동남아 국가들은 다양한 발전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①국내정치적으로 동남아의 신생 정부들은 어떠한 외교정책적인 방향에 상관없이 대부분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권위주의 체제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강력한 군부의 지지를 그 바탕에 두고 있었다. 미얀마는 1962년 이후 군부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등의 사회주의권에서는 공산당의 일당독재적인 리더십이 국가의 정치와 경제를 독점적으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말부터 그동안의 경제적 발전,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 교육의 보급 등의 결과로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의식과 정치경제적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권위주의적 국가 및 군부정권에 대한 사회의 도전이 갈수록 강해져, 필리핀에서는 1986년 마르꼬스 정부가 무너졌으며, 태국에서는 1992년 재집권을 시도하던 군부가 퇴진했고, 미얀마에서는 1988년 비록 “미완의 민주화”로 끝나고 말았지만 군부 독재에 대한 과감한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②탈식민지 시대 대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빠른 산업화를 경제적 목표로 내세워 50-60년대에 섬유산업 등 경공업에 치중한 수입대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그러나 1960년대말부터 특히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지향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서방 선진국들 특히 미국, 일본으로부터 많은 자본이 유입되었으며, 이로써 세계 경제의 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져 갔다. 한편 경제적 발전은 이농(離農)과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유입, 이로 인한 도시의 비대화 및 도시 범죄의 증가를 초래했다. 특히 산업발전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경제정책과 사회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불러일으켰고, 미성년자 고용 및 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노동착취와 노동운동의 억압 등 노동문제를 야기했다.
③이러한 사회적 문제들과 함께 동남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오늘날까지 소수민족 문제를 포함한 종족갈등을 안고 있다.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국가통합의 과제와 직결된 이 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필리핀 남부와 태국 남부에서는 무슬림들의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쩨의 ‘이슬람공화국’ 수립운동과 동티모르(East Timor) 분리독립운동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들도 각각 이슬람과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오랫동안 카렌족, 몬족, 샨족, 까친(Kachin)족 등이 양곤 정부에 저항했다. 특히 카렌민족연합의 카렌족 분리독립운동은 1995년 그 거점이 미얀마 정부군에게 점령될 때까지 세계 여론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종족문제는 말레이족이 어떻게 중국인들을 정치경제적으로 통제하되 국민국가에 수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레이족의 이해관계를 확대하느냐에 집중된 것으로서, 그것은 부미뿌뜨라(bumiputra) 정책으로 표출되었다.
④끝으로 살펴 볼 것은 현대 동남아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민족주의가 독립 후에도 여러 동남아 국가들의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와 경제의 방향에 종종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해 비관용적이며 심지어 강한 배타적 에너지를 발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동남아시아 종교
동남아시아의 다양성은 민족적 구조 외에 종교에서도 나타난다. 동남아시아에는 주요 세계종교들이 모두 들어와 있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는 통상 소승불교로 알려져 있는 상좌불교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는 이슬람이, 필리핀과 동티모르에는 가톨릭이, 베트남과 싱가포르에는 대승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합친 이른 바 중국종교가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잡아 있다. 이 중국종교는 동남아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화교들의 차이나타운의 중국 사당들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도처에서 만날 수 있는 힌두교 사원에서 엿볼 수 있듯이, 또 다른 아시아계 소수민족인 인도인들 역시 자신들의 종교인 힌두교를 동남아시아 사회에 이식하였다. 19세기 이후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해 들여온 개신교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도 지배적인 종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고 동남아시아의 어느 특정 민족의 종교로도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남아시아에는 이상의 세계종교들 외에도 다양한 민간신앙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조상신숭배와 지역신 및 토지신 신앙, 정령신앙, 주술신앙, 샤머니즘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태를 취한다. 그 기원을 짐작하기 어려운 민간신앙들은 동남아시아 사회에 도입된 세계종교들에게서 처음에는 배척되었지만 점차 수용되어 오늘날에는 서로 깊이 결합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종교는 종종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종교가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정도이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인구의 절대 다수가 한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다. 말레이시아는 인구 전체로 보면 무슬림 인구비율이 50%밖에 안 되지만, 이 나라의 다수민족인 말레이인 경우는 거의 100%가 이슬람을 믿는다. 필리핀은 인구의 83%가 가톨릭 신자이고, 최근 독립한 동티모르에서는 가톨릭 인구비율이 90%에 달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종교는 문화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종종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동남아시아의 종교 세계에서 지난 2-30년간 뚜렷한 추세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불교이건 이슬람이건, 자본주의권이건 사회주의권이건 모든 나라들에서 종교와 신앙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의 불교(소승불교)
불교의 교세는 1900년에 전세계인구의 7.8%에 달하던 것이 1970년에는 6.3%, 1995년에 6.0%, 2000년에는 5.9%이다. 2000년 불교신도는 3억6천 만명 정도 이며 소승불교는 1억 2천만명 정도이다. 그리고 이 소승불교 신도는 동남아에 속해 있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집중되어 있다.
①미얀마 불교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72.7%를 점하고 있는데 주로 미얀마족과 산족들로 구성되어 있다.(2.511.664명으로 인구의 5.5%를 점한다.)
②태국 불교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85.3%를 점하고 있으며 24,000개의 사원과 200,000 명의 승려가 있다.(개신교는 303,000명으로 인구의 0.5%이다)
③캄보디아의 불교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84.7%에 달하며 2,826개의 사원과 68,145명의 승려가 있다.(개신교는 21,500으로 인구의 0.2%이다.)
④라오스의 불교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48.8%를 점하고 있으며 1,900개의 탑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개신교는 32.000명으로 인구의 0.6%이다.)
소승불교의 사회적 역할
소승불교는 동남아의 소승불교국인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교육, 문화, 사회,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①교육 - 이들 네 나라에서 최초의 학교는 불교 사원에서 시작되었고 승려들은 종교상의 의무 외에도 지역 아이들에게 기초과목을 가르쳤다. 이를 사원학교라고 하는데 전국에 두루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존재하며 지역 사회에 두루 큰 영향을 주고 있다.
②경제 - 국가 재정의 태반이 사원 건립과 사원유지로 사용되며 민간경제의 상당부분이 불교와 관계된 것에서 순환된다.
③일상생활 - 인생의 통과의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즉 출생, 출가, 결혼, 죽음이 중요한 시기에 불교는 중요한 기여와 가치를 만들어 간다.
④사회복지 - 승려들은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온 힘을 다하기도 하고, 정신이상자, 마음의 안식을 구하는 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
⑤정치 - 동남아의 네 나라는 불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이므로 왕은 ‘탐마라차(불법을 지키는 정의로운 군주)’라는 불교적 이상을 실현해야 그 권력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동남아의 이슬람
이슬람은 동남아 전체 인구의 약 38%인 2억 1천만명이 믿고 있는 종교로, 동남아의 세계종교들 가운데 신자의 수가 가장 많다. 이슬람은 13세기 말 이후 동남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여 16세기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과 필리핀 중부지방으로 퍼져나갔다. 이슬람이 타이, 베트남등 대륙부로 퍼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불교나 유교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널리 믿는 국교로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남아에 들어온 이슬람은 다른 종교들이 그랬던 것처럼 토착적인 관통관습과 민간신앙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민중 사이에 보다 쉽게 퍼질수 있었다.
이로써 이슬람은 강한 혼합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동남아 이슬람에서는 조상신 및 자연정령 등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슬람 신앙 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동남아에서 기독교 선교의 문제
동남아에서 기독교 선교는 16세기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300년 이상 스페인의 통치를 받아 대부분 가톨릭화된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의 보급이 여전히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동남아 사회에는 기독교 도입 이전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도종교들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는 테라바다불교가, 베트남에서는 유교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에서는 이슬람이 각각 사회의 보편적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강력한 토착 문화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동남아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동남아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식민주의의 기운이 아시아로 팽창하던 19세기에 들어서서부터였다. 동남아에서의 사역에 임한 선교사들이 당면했던 첫 과제는 성경을 토착어로 번역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현지언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그러나 토착사회 민중들의 일상언어를 배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동남아 대부분 지역의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들은 원래 동남아 언어가 아닌 외래언어로 쓰여진 경전들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테라바다불교의 불경들은 인도의 팔리(Pali)어로, 이슬람의 꾸란은 아랍어로, 베트남의 대승불교 경전들은 한자인 쭈뇨(Chu nho) 혹은 이로부터 파생한 대중적 문자인 쭈놈(Chu nom)으로 쓰여져 있었다. 즉 수세기간 동남아의 전통사회는 초자연적 세계와 신과 인간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종교적, 도덕적, 기타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외래언어의 용어들로써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선교사들은 성경의 많은 신학적 개념들을 토착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로 번역하기 위해 경전언어까지도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습득해야 했다.
그러나 정작 토착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번역된 성경말씀을 갖고서도 기독교의 우월한 권위를 토착인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무엇보다도 불교승려, 이슬람 교법사, 무당, 주술사 등 그 권위가 토착사회의 전통 속에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종교지도자들로부터 강한 영적인 경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또한 그 정치적 정당성이 상당 부분 토착사회의 전통적인 종교에 의존되어 있는 동남아의 여러 통치자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두려워했다. 그밖에도 다른 문화권에서, 그것도 동남아의 전통적인 정치체제와 문화에 위협적인 서구의 국가들로부터 온 이방인으로서의 선교사들은 아무리 현지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토착인들의 사회생활의 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다.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한 유명한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이 1813-1850년간 미얀마 선교사역에서 당한 고초도 불교를 옹호하는 미얀마 왕을 비롯한 당시의 통치계층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서양인들에 대한 미얀마 사회의 전반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때문에 개신교 선교의 초기인 19세기 전반 동남아에서 선교사들이 획득한 개종자들은 대부분 불교, 이슬람 등 제도종교의 영향하에 있으며 동남아 지배계층의 정치적 권위가 확고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아니라, 고산족들이나 외곽도서에 사는 소수종족들 혹은 중국에서 이주해온 중국노동자들 등 토착사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선교가 빈약한 원인 - 허버트 케인
①오래된 전통과 발달된 문화 -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 민족들은 그들의 문화를 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서양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여긴다.
②고도로 발달된 오래된 종교들로부터의 도전 - 동남아시아의 종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창건자, 교리철학자, 종교개혁가들이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사원과 탑 그리고 수도원들을 갖고 있다. 동남아시아인들은 그리하여 그들의 종교들을 최고의 것으로 믿고 있으며 따라서 종종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
③깊고 오래된 사회적 및 종교적 관습에서 오는 저항 - 동남아시아의 모든 문화에는 기독교 복음에 적대적인 관습과 편견이 있다.
④식민통치와 기독교간의 긴밀한 관계 - 복음과 식민지배를 위한 무력간의 관계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20세기 중엽까지 1세기간 복음과 무력간의 성스럽지 못한 이러한 동맹관계는 선교사들의 복음전파 사역에서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⑤기독교의 배타성 - 기독교는 유일한 참된 종교라는 자세로 들어와 모든 다른 종교들을 그릇된 종교로 배격했다. 이러한 관점은 당연히 돈만아시아의 종교지도자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동남아시다 각국 개관
1. 미얀마 개관
국명 | 미얀마연방 (Union of Myanmar) | 종족 | 버마족 70% 소수족 25%(카친, 카렌, 몬, 라카인, 친, 샨, 카야족등) 기타(중국, 인도등) 5% |
위치 | 인도지나반도 서북에 위치(동부로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로는 중국, 서부로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 언어 | 미얀마어(공용어), 통용가능어-영어 : 대도시 중국어 : 중국접경지역 태국어 : 태국접경일부지역 |
면적 | 676,577 km 2 (한반도의약 3.5배) | 정부형태 | 군사과도정부 |
수도 | 양곤(Yangon:593만명)(2002/2003년) | 1인당 GDP | US$ 153불(2003년) |
인구 | 5,217만명(2002/2003) 남자:2,594만명, 여자 2,623만명 | 종교 | 불교 89.5%, 기독교 5%, 회교 4%, 힌두교 0.05%, 정령숭배 1.5% |
2. 라오스 개관
국명 |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 종족 | 라오룸(50%), 라오퉁(30%), 라오숭(10%)족 등 총 47개 종족 |
위치 |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는 내륙국가 | 언어 | 성조어(6성)이며, 태국어와 유사(라오스어와 태국어간 상호 의사소통 가능) |
면적 | 236,800 ㎢(한반도 전체의 약 1.1배) | 정부형태 | 대통령제(임기 5년, 국회에서 선출) |
수도 | 비엔티엔(인구 약 53만명) | 1인당 GDP | 364불(‘03)
|
인구 |
540만명(2002년 기준)-인구밀도 : 23명/㎢ (동남아 국가중 최저)
| 종교 | 불교(90%), 정령신앙,기독교 |
3. 캄보디아 개관
국명 |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 종족 | 크메르족 90%, 소수민족(중국, 베트남, 참족, 고산족) |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북위 10-14도, 동경 103-107도
| 언어 | 크메르어, 불어(50대 이상), 영어(청, 장년층) |
면적 | 181,035㎢(남한의 약 1.8배, 한반도 전체의 약 80%), 남북 450㎞, 동서 580㎞, 해안선 340㎞ |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왕국)으로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정부수반인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
수도 | Phnom Penh(인구 약 120만명, 면적 375㎢) | 1인당 GDP | 454불 (2005) |
인구 | 약 1,390만명(2005년) 인구밀도(㎢) : 76.8명 인구증가율 : 1.46% 인구 성비 : 여성 100명 대비 남성 94.3명
| 종교 | 소승불교 90%, 무슬림 3%, 정령숭배5%, 기독교 0.2% |
4. 베트남 개관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종족 | Viet족 89%, 타이, 므엉, 크메르 등 53개 산악소수민족, 화교(약 100만) |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 동부, 중국ㆍ라오스 및 캄보디아에 인접 | 언어 | 베트남어(공용어), 91.07% (2005년) |
면적 | 33만 341㎢(한반도의 약 1.5배) | 정부형태 | 사회주의공화제(공산당이 유일정당) |
수도 | Hanoi(인구 : 약300만명) | 1인당 GDP | 05년도 640불 |
인구 | 8,312만명(2005년 추정, 약 74%가 농촌 거주) | 종교 | 불교신도 약 1,000만명, 카톨릭신도 약 550만명, 개신교 약 130만명 등 |
5. 태국 개관
국명 | 타이랜드 왕국 (Kingdom of Thailand) | 종족 | 타이족 (81.5%), 화교 (13.1%), 말레이족 (2.9%), 기타 (2.5%) |
위치 | 동남아, 인지반도 북부 | 언어 | 타이어 (공용어) |
면적 | 51.4만 K㎡ (한반도의 2.3배)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수도 | 방콕 (Bangkok : 인구 약 564만명) | 1인당 GDP | 2,724불(109,676바트) |
인구 | 6,499.7만명 (2005년도말) | 종교 | 불교736만명(91.8%) 회교298만명(4.8%),기독교101만명(1.6%),기타(Hindu,Sikh, Brahmin) |
6. 말레이시아 개관
국명 | 말레이시아 (Malaysia) | 종족 | 부미푸트라(58%),중국인(25%),인도인(7%),기타(3%),외국인체류자(7%) |
위치 | 동남아 적도 북단에 위치 | 언어 | 말레이어가 공용어이나, 영어가 널리 통용 |
면적 | 329,733㎢ (한반도의 약 1.5배)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수도 | Kuala Lumpur (인구 약 170만, KL생활권역 인구 약 450만) | 1인당 GDP | 4,352$ |
인구 | 2,560만명 | 종교 | 회교 53%, 불교 17%, 유교 12% |
7. 싱가포르 개관
국명 | The Republic of Singapore(싱가포르 공화국) | 종족 | 중국계(76.2%), 말레이계(13.8%), 인도계(8.3%), 기타(1.7%) |
위치 | 말레이반도 남단
| 언어 |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
면적 | 697.1㎢(서울특별시 면적 : 605.5㎢)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수도 | 싱가포르 | 1인당 GDP | 26,832$(S$44,666) |
인구 | 약 435만(1년이상 거주 외국인 80만 포함) | 종교 | 불교·도교(51%),이슬람교(14.9%), 기독교(14.6%), 힌두교(4.0%) |
8. 인도네시아 개관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 종족 | 자바족(4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
위치 | 동남아 말레이 군도 | 언어 | Bahasa Indonesia(인니어) (자바어, 순다어 등 지방어 및 지방사투리를 포함 모두 583종)
|
면적 | 190만㎢(한반도의 9배)
도 서 수 : 17,508개(무인도 7,133개)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수도 | 자카르타(인구 약 1050만명, 면적 662㎢) | 1인당 GDP | 1,181불(2004) |
인구 | 2억 15백만명(세계 4위, 인구증가율 1.4%) 자바 1억 1,500만명, 수마트라 4,100만명, 칼리만탄 1,000만명, 슬라웨시 1,400만명, 이리얀자야 200만명 | 종교 | 회교(87%), 기독교(6%), 카톨릭(3%), 힌두교(2%), 불교(1%), 기타 |
9. 부루나이 개관
국명 | 브르나이 다루살람(Brunei Darussalam) | 종족 | 말레이계 66%, 중국계 11%, 토착인종 4%, 기타 19% |
위치 | 보르네오섬 북부 연안 | 언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및 기타 토속어도 사용 |
면적 | 5,765㎢ (경기도의 약 절반) | 정부형태 | 세습 절대 왕정제 |
수도 | Bandar Seri Begawan(면적: 16㎢, 인구 : 약 46,000 명) | 1인당 GDP | 26,500브불 |
인구 | 357,800명 (2004년 기준) | 종교 | 회교 67%, 불교 13%,기독교10 %, 토착종교 10% |
10. 필리핀 개관
국명 |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종족 | 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다수 |
위치 | 동남아, 중국대륙 동남방 태평양상 | 언어 | 영어 및 타갈로그어(Tagalog) |
면적 | 300,400㎢(한반도의 1.3배) 7,107개의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루손(104,688㎢)과 민다나오(101,999㎢) 섬이 총면적의 65% 차지
| 정부형태 | 대통령제, 6년 단임 |
수도 | 마닐라(Manila) | 1인당 GDP | $1,017 |
인구 | 8,520만명 | 종교 | 천주교 83%, 기독교 9%, 회교 5%, 기타 3% |
동남아시아 선교전략
소승불교권 선교전략
지금까지의 선교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선교전략
①필요 중족적(Felt need) 선교전략
초기의 기독교 교회가 소승불교권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불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불교나 이들 문화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은 정치 사회적 유대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육체적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거나 현지 교인을 고용하여 사역자로 사용하고 교회를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참된 기독교를 전하기보다 서구 기독교 사회를 확산시켜서 명목적인 기독교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박해와 배척의 원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불교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은 엄밀한 입장에서 아무런 접촉점이 없기 때문이며 신학적 구조가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선교는 종교외적인 요소로 선교했었고, 기독교는 불교도들에게 자신들의 국가와 문화를 위협하는 정치경제 권력이나 서구문화의 대리자로 보였다. 선교사들은 선교를 너무 쉽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은 박해의 주 이유가 되었다.
②접촉점을 통한 방법
기독교와 불교의 유사성을 접촉점이나 전도시작점으로 두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윤리, 도덕점 관점이다. 불교의 공덕, 의식과 형태 등을 전도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인데 이 전략은 서민에게 사용이 가능하나 불교적 기독교 같은 혼합주의의 위험이 있다. 이 전략은 민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절하나 불교 같은 체계화되고 견고한 사회체계를 가진 고등종교에는 적절치 못하다.
③변증법적 전도전략 - 세계관 대결, 진리대결
이 전략은 선교사가 불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승불교권 국가들은 불교가 사회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며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견고한 공동체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사회는 그 성격상 단 시간에 깨어지기 어렵다.
동남아시아의 소승불교권 나라들은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리고 그 접근의 형태는 선교사의 은사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다. 그들의 Felt need를 채우는 접근으로 NGO형태의 병원, 학교, 고아원과 같은 사회시설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교회개척과 같은 직접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승불교권에서의 선교는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오랜 시간 구축해온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기독교의 선교는 장기적이여야 한다. 단순한 개종이 아니라 온전한 회심을 선교의 목표로 확정해야 한다. 또한 회심자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은 소승불교권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승불교권의 사람들은 고행하고 정진하며 수행하며 모든 것을 헌신하는 승려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사원의 존재를 매일 본다.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회심자의 교회 모습을 가시적으로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회심 이후의 제자훈련과 같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이들 나라에서도 필요하게 되었다.
공산권 선교전략
동남아에서 공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탄압이 존재한다. 시장경제로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긴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선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인 것이다. 다양한 종교사원과 수많은 관광객들을 보면 억압과 규제보다는 자유분방함을, 종교에 대한 핍박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품에 안아 하나로 만드는 관대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복음전파 뿐만 아니라 NGO를 비롯한 사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결코 감시를 늦추지 않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의 선교사역은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을 받는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평상시에는 별로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어서가 결코 아니다. 정부기관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와 감시를 늘 받는다.
선교전략
이들 나라들은 선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선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의 창의적인 형태로 접근해야만 하며 이것은 선교지에서의 접촉점이 될 뿐만 아니라 제약으로 인한 선교전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①NGO
공산화로 인한 폐쇄정책 때문에 이들 나라는 시장경제가 뒤늦게 도입되었으며 정책의 초점이 경제개발에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한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유입과 오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빈민층의 형성이 심각한 형편이다. 이를 위해 NGO는 사회사업과 관련된 분야들 특히 교육, 의료, 빈민을 위한 무료급식, 전쟁피해자들등 정부도 감당치 못하는 이들을 돌보는 것을 접촉점으로 하며 가장 쉬운 접근 전략이 될 것이다.
②교육
경제가 개방되고 외국의 투자가 많아짐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외국어와 컴퓨터 같은 직업적인 필요의 교육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다. 정부에서도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로 접근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비교적 규제를 하지 않으며 호의적이기도 하다. 또한 이렇게 교육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 접촉 대상이 경제활동을 원하는 사회 중심층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독교 영향력도 막대해 질 수 있다.
③비지니스
경제 개방과 함께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방법도 한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슬람권 선교전략
동남아 이슬람은 전통문화에 적응되었으며 신앙의 내면화를 이루는 슈피(Sufi) 이슬람으로 온정적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무슬림들이다. 그러므로 동남아 지역의 무슬림들은 개방적이며 상호 존중하고 이해할 줄 아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며 적대시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서구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무슬림을 먼저 탄압하며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타적인 정신에 대한 적대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월적인 서구 기독교의 색채를 벗어버리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곳의 이슬람이 중동의 이슬람처럼 하나로 단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이며 인종적인 문제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이슬람의 문화적인 색깔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를 깊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